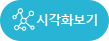| 항목 ID | GC05702071 |
|---|---|
| 한자 | 今時發福-明堂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 집필자 | 박순호 |
|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 1989년 6월 19일 - 「금시발복의 명당」 채록 |
|---|---|
| 채록지 | 「금시발복의 명당」 채록지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
| 성격 | 설화 |
| 주요 등장 인물 | 오누이 |
| 모티프 유형 | 민담 |
| 제보자 | 이창래[남, 78세]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에 전하는 설화.
[채록/수집 상황]
1989년 6월 당시 78세의 이창래에게서 채록한 「금시발복의 명당 설화」는 2000년에 간행된 『군산 시사』에 기록되어 있다. 채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제보자 이창래는 조사자만 있는데도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는 듯 막히는 데가 없이 열심히 구연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내용]
그 전이 어떤 사람은 홀아비로 지내는디, 한 사십여 세 홀아비로 지내는디,〔목청을 가다듬고 나서〕 암것[아무것]도 읎어[없어]. 그서 언먹막[언덕막]의 외[오이]나 놔먹고 사는디, 참 밭 멫 마지기 짓던가 암것도 읎고 그것만 짓고 사는 사람인디,
하루는 인자 그 원두막으설락컨 외를 놓고서 지키고 있는디, 아조[아주] 원두막으다가서 도고통[절구통]갖다 놓고 거그서 보리방아 찧어서 먹어감서 걍[그냥] 거그서 살어. 걍 홀애비로 거시기 허는디, 아 저녁때 석양(夕陽) 판[무렵]이 되았는디 웬 나나리 보따리[괴나리봇짐] 짊어진 노인 하나가 올라온다 그말여. 원두막으로 올라와.
“후유!”
허고 올라와설락컨,
“아, 여그서 쉬어 가야겄다.”
본게 시장헌 것 같어. 그리고 외를 따다가 디렸어[드렸어]. 감식(甘食)을 혀, 그나지나 잘 자셔[잡수셔]. 아, 저녁때 다가서 ‘갈까?…’ 힜더니 가도 않네. 그서는 인자[이제] 앉었네. 앉어 갖고서람은 안갈 작정혀. 하, 이것 인자 도고통으다 보리방아 찧어갖고 삶아서 보리밥 삶어 가지고 그래도 맛있게 먹네. 먹고서는 안 가. 참 그나지나 환장허겄지. 아인자 그날 저녁으 자고서 난게 그때 또 하나가 올라오네. 영감 하나가 올라오네.〔조사자 : 그 분 말고?〕음-. 올라와, 본게스니 파립(破笠)힜는디 시장헌 것 같아서 외를 좀 따다가 디린게,
“아 이것 좋다!”
고 자셔. 인자 그런 직후는 먼저 온 노인 양반이 뭐라 허는고니,
“주인장어게[에게] 미안헙니다. 여그 와서 이렇게 폐를 끼치고 본게 으떻게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헐 말이 없다고, 근게, 그 답례로 땅이나 하나 내가 잡어 주리다.”
그러므는 이것이 땡(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고니 자시(子時)의 하관시(下棺時)요, 축시(丑時)의 발복시(發福時)여 게가[거기가] 〔조사자 : 하이고 빠르네!〕음, 빠르지. 그 인자 자기 홀애비 저그 선친인디 말여, 선친인디. 누가 하나도 없어. 그리갖고서는 남의 동네 당산(堂山)이가 뫼(묘, 墓)를 쓸 참여. 근게스니 누구 데리가도 못혀. 허는디 그 늙은이들 둘허고 자기허고 서이[셋이] 가네 인자. 가서 참 뫼를 파가지고 설락커니 가서 인자 뫼를 쓰게 되는디, 먼저 온 양반은 여그다 씨작커니, 아 그런디 먼저 온 양반은,
“여그다 씨먼은[쓰면] 여그서 바로 금시발복(今時 發福) 은 못허지만서도 여그서 정승(政丞)이 날 자리다. 예가[여기가]. 이런 디[데]다 써야지 임시(臨時) 발복 자리다만 씰라고[쓰려고] 그러냐?”
헌게스니 나중의 온 이가 말여,
“무슨 소리냐. 밥이 사는 것여. 밥을 먹어야지 정승도 허는 것이지, 밥도 정승허는 것여?”
아, 익서 시끄러가지고 까딱허먼 뫼도 못허게 생겼어. 〔웃으면서〕먼저 온 이가 졌네.
“근게, 보쇼. 그러면 자시 하관시, 축시 발복인디 말여. 밥을 먹으면 인자〔부채로 방바닥 이쪽 저쪽을 가리키며〕거그다 써, 인자 여그다 써, 인자 또 파다 여그다 써.”
그렇게 회의가 되았네 인자. 홀애비가 젠장의 원두막으서 사는 홀애비가 좋은 땅 얻어갖고 뫼를 쓰는디 그 인자 나중으는 그 영감 말대로 거그다 썼네 인자 뫼를, 자시 하관시 축시 발복으다 썼어. 써가지고 집이 내리갔어. 인자 뭣이 있어야지, 암 것도 없네, 집이라는 것이 원두막인게 뭐. 저 낼[내일] 아침이 저 양반들을 밥을 히서 디리야겄는디 보리껍밥을 맨들 수도 없고 어디케 쌀을 인자 어찌케 헐 수도 없고, 뭐냐스니 그 동네 과택(寡宅)이 있어. 과택이 부자여. 근디 ‘과택한티 가서 내가 한 번 사정히야겄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디, 과택이 새벽녘이 된게스니 꿈을 뀌는디 말여. 즈[자기] 선조라는디 말이지, 선조라는 저 뭣이라는디 말이지 꿈으 선몽, 현몽( 顯夢)을 허는디,
“네 여 들어봐라. 내일 새벽으 인제 다섯 시나 여섯 시 근방되먼 말여, 되먼은 무슨 사람이 찾을 것인게 찾으먼은 그 사람 후이 대접해라.”
그거여.
“글 않으면[그렇지 않으면]니가….”
그 자식 하나 있어. 그 과택이 자슥 하나가 있어. 참 유복자(遺腹子)로 하나가 있어. 그것이 그 크는 자식이 있는디 그때는 아마 댓 살 먹었던 자슥이 있는디,
“그리야만이 자슥 킨다[키운다]. 글 않으면 자식을 못 키는 것이다. 근게스니 내 말 명심허렸다.”
허고서 읎어져 버려. 아, 전날 자다 보닌게 또 와서 선몽을 허네 그려.
“너 명심허냐? 너 까딱허믄 큰일 나. 근게 너 명심허라.”
허고서 또 선몽을 허고 가. 그러자마자 와서 인자 대문을 뚜디려[두드려], 와서. 그 인제 홀애비가 와서 대문을 뚜디려. 뚜디린게스니 문을 열어.
“들오라.”고 근게스니 건넛 마을 사는 홀애비여.
“어찌, 이리 오셨냐?”고.
“아하, 그런게 아뇨. 내가 아다시피 참 원두막으서 살고 그런 사람 아니요? 해마다 그런 사람인디, 근디 웬 지관(地官)양반들 둘이 오셨는디, 내 엊저녁에 우리 아버지 장사(葬事)를 지냈소. 지냈는디 그 노인네들 아침을 히디리야겄는디 뭣이 건지가 없어요. 그서 시방 쌀 멫 말나 얻으러 왔습니다.”
허허, 가만히 생각히 본게스니 꿈을 선몽하던 거시기 생각히 본게스니 그냥 말어선 못 쓰겄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믄 되로[도로]가 두 분 다 모시고 오쇼.”
그려. 아, 모다 데리고 오라는 것여, 가서〔웃으면서〕그 말 헌게 인자 주욱 따러 오네, 둘이 따러 와.
“아, 봐. 금시발복이 아녀, 여그가? 자시 하관시, 축시 발복 아녀, 여그가? 인자 발복 되았어 인자.”
닭을 잡어서 막 걍 대접을 허네, 그 판에 가서 잘 먹었네. 먹고서는 인자 가는디
“인자 그런 것을 안에서도[아내 쪽에서도] 써야 혀, 그리야 정승이 나.”
하나는 안에서 가서 써줬어. 또 가서 받어서 써줬어, 금방 발복이 힜다는디. 그러가지고서 거그서는 그 홀어머니 자슥을 말이지 담어 가지고서 그 자식이 정승을 힜어.
그리서 그런 예가 있는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여.〔조사자 : 홀에미허고 살고?〕암믄, 살고 말고. 홀에미허고 살고 자식 제 자식 내고 말여. 그리고 거서 또 자식 낳고 그럴테지.〔조사자 : 자식은 정승하고?〕암믄, 응.〔조사자 : 속 빠르네.〕〔웃으면서〕그런게스니 그런 땅을 보야는디 어떤 놈이 그 알어야지 그것을….
- 『군산 시사』(군산 시사 편찬 위원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