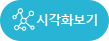| 항목 ID | GC60000713 |
|---|---|
| 한자 | 科擧制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광주광역시 |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
| 집필자 | 노성태 |
고려와 조선시대에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
과거제는 학문적 능력을 가려 관리를 뽑는 제도로, 고려시대인 958년(광종 9)에 처음 도입되어 조선 말까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제가 정착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과거에는 문과, 무과, 역과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영예롭고 고위 관직으로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문과였다. 조선 왕조 500여 년간 문과는 총 804회가 실시되었고, 여기서 배출된 급제자는 15,000여 명이었다. 영조 이후 문과 급제자 5,000여 명 중 서울[한양] 출신이 약 30%이었고, 그 뒤를 이어 평안도·경상도·전라도 순이었다. 전라도는 영조 이후 급제자의 7% 정도인 380여 명이었다. 3년에 한 번 실시된 문과 시험 1등 합격자를 장원급제자라 불렀는데, 조선시대에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장원급제한 인물은 박순(朴淳)[1523~1589], 고경명(高敬命)[1533~1592], 이발(李潑)[1544~1589]이었다.
1798년(정조 22년) 광주목 객사였던 광산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과거 시험이 치러졌다. 1579년 정철, 고경명 등이 면앙정에서 스승인 송순을 위한 과거 합격 60주년을 기리는 회방연(回榜宴)을 베풀었는데, 200여 년 뒤 정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라도 광주에서 특별한 과거를 치르게 하였다. 정조는 호남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을 치르도록 명한 후 첫날 실시된 시(詩)의 제목인 ‘하여면앙정(荷輿俛仰亭)’ 의 시제(試題)를 직접 내렸다. 특별 과거 시험의 시제인 ‘하여면앙정’은 200여 년 전인 1579년 송순의 회방연 때 송순의 제자들이 스승을 가마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준 것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쓰라는 내용이었다. 이 특별 시험에 69명이 응시하여 3일간에 걸쳐 시(詩)·부(賦)·전(箋)·의(義)·책(策) 등 5과목의 시험을 치렀는데 고정봉과 임흥원이 공동 1등으로 합격하였다.
- 『광주읍지』(광주직할시, 1990)
- 『광주시사』1(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2)
- 『1798년 광주의 과거 시험』(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5)